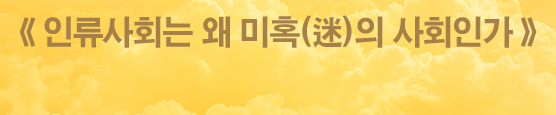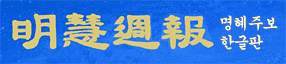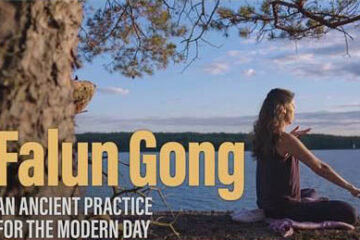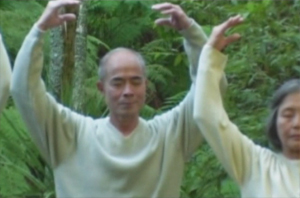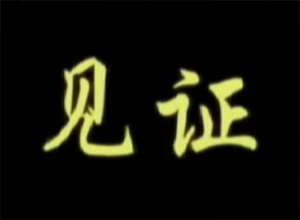글/ 문이명(聞以明)
[명혜망]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인(忍)’에 대한 주석은 ‘능야(能也)’이며, ‘능(能)’은 《설문해자》에서 ‘웅속(熊屬)’으로 분류된다. “능수는 속이 굳세므로 현능이라 칭하고, 강하고 튼튼하므로 능걸이라 칭한다(能獸堅中, 故稱賢能, 而强壯, 稱能傑也).” 이처럼 곰은 능력자 중의 걸출한 자의 상징이었다.
화하(華夏)족의 시조인 황제(黃帝)는 ‘유웅(有熊)’이라는 호를 가졌는데, 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산해경(山海經)》에서 대우(大禹)가 치수할 때 신웅(神熊)으로 변해 산을 열고 땅을 개척하며 가시덤불을 헤쳐나간 것은 곰의 현명함과 견인불발(堅忍不拔)의 본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고사들은 우리에게 ‘인(忍)’ 속에 담긴 깊은 내포와 의미를 보여준다.
소무의 양치기
기원전 100년, 흉노가 한나라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계 개선을 원했다. 한무제(漢武帝, 기원전 156-87년)는 소무(蘇武, 기원전 140-60년)를 백여 명과 함께 흉노에 파견해 선우(單于, 흉노의 최고 통치자)에게 답례하도록 했다.
소무 일행이 한나라로 돌아가려 할 때 흉노 내란을 만나 억류됐고, 흉노에 귀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선우는 먼저 한나라 출신 투항자를 보내 자신이 얻은 금전과 관직을 예로 들며 소무를 설득했지만, 소무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선우는 소무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아 장기간 고통을 주어 굴복시키려 했다.
때마침 겨울이 되어 하늘에서는 거위털 같은 눈이 내렸다. 소무는 지하 감옥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으며, 목이 마르면 한 줌의 눈을 움켜쥐어 갈증을 달랬고, 배가 고프면 양가죽 조각이나 가죽 띠 같은 것을 뜯어 씹으며 배를 채웠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굶어 죽지 않았다.
선우는 모든 방법으로도 소무를 굴복시킬 수 없자 그를 북해(北海, 지금의 바이칼 호)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유배 보내 양을 치게 했다. 그러면서 “숫양이 새끼를 낳으면 한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소무는 북해로 보내졌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한나라 조정을 상징하는 정절(旌節, 사신에게 수여된 지팡이 모양의 명령봉)만이 그와 함께했다. 흉노는 그에게 식량을 주지 않았고 그는 들쥐 굴에서 풀뿌리를 캐어 배를 채웠다. 날씨가 추워지자 양떼 속에 끼어들어 추위를 막았다.
선우는 소무의 처지를 알고 다른 한나라 출신 투항자를 보내 그를 설득하게 했다. 그는 간곡하게 설득했지만 소무는 말했다. “나는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소. 꼭 나를 항복시키려 한다면 오늘 연회를 끝내고 당신 앞에서 죽게 해주시오.” 설득하러 온 사람은 소무의 지극한 충성심을 보고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아, 정말 의로운 사람이로다! 그를 설득하려는 우리야말로 죄가 크구나.” 그는 눈물을 흘리며 소무와 작별했다.
소무는 매일 한나라 조정의 정절을 짚고 양을 쳤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절에 달린 깃털 장식은 모두 떨어져 나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며,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했다. 19년이 흘렀다. 소무의 수염과 머리카락은 이미 모두 하얗게 변했다.
한나라가 우연히 소무의 소식을 알게 되어 북해에서 장안으로 데려왔다. 떠날 때는 장년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백발노인이 되어 있었다. 장안에 도착한 그 순간에도 그의 손은 여전히 닳아 없어진 정절을 꽉 쥐고 있었다.
침을 뱉어도 닦지 않다
당나라 측천무후(武則天, 624-705년) 시기에 누사덕(婁師德, 630-699년)이 재상이었다. 그의 동생 누사영(婁思潁)이 대주자사(代州刺史)로 임명되어 떠나기 전에 누사덕이 물었다. “나는 재상이고 너도 주목(州牧)을 맡게 되었다. 우리 집안이 너무 영광스러워 남의 시기를 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겠느냐?” 누사영이 대답했다. “앞으로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감히 대꾸하지 않고 침을 닦아내기만 할 테니 형님은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사덕이 말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다. 남이 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너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다. 네가 침을 닦으면 불만스럽다는 뜻이 되어 상대를 더욱 화나게 할 것이다. 너는 웃으며 받아들이고 침을 닦지 않고 저절로 마르게 해야 한다.” 이것이 ‘타면자건(唾面自乾)’의 유래로, 극도의 모욕을 받고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명하고 겸손한 자세
누사덕은 일찍이 적인걸(狄仁傑, 630-704년)을 재상으로 천거했다. 적인걸은 재상이 된 후에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여러 차례 누사덕을 배척해 외직으로 보냈다. 측천무후가 이를 눈치채고 적인걸에게 물었다. “누사덕은 현명한가?” 적인걸이 대답했다. “그는 장수로서 신중하게 직무를 수행하지만 현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측천이 또 물었다. “누사덕은 사람을 알아보는가?” 적인걸이 대답했다. “신이 그와 함께 일했지만 그가 사람을 알아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측천무후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재상으로 쓴 것은 바로 누사덕이 천거했기 때문이니, 그는 확실히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러고는 당초 누사덕이 천거한 상주문을 꺼내 보여주었다. 적인걸은 부끄러워하며 탄식했다. “누공의 큰 덕이여, 내가 그의 관대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알지 못했으니 나는 그에게 훨씬 못 미치는구나!”
맺음말
노자(老子, 기원전 571-470년)는 《도덕경(道德經)》에서 이렇게 썼다. “변치 않는 덕을 지켜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아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常德不離, 復歸於嬰兒), 변치 않는 덕을 그르치지 않으면, 다시 무극의 상태로 돌아간다(常德不忒, 復歸於無極).” 성인이 일을 처리할 때는 고정된 도덕 진리를 지침으로 삼아 강권이나 명예, 이익에 미혹되지 않고, 천연스럽고 소박하며, 세속을 따르지 않고 권세에 아부하지 않으므로 실수가 없다.
소무는 극한의 곤경에 직면해 범인을 초월한 인내심으로 절개를 지키고 뜻을 굳게 하며 초심을 바꾸지 않아 ‘변치 않는 덕을 지켜 벗어나지 않았다’. 누사덕은 당나라의 재상이자 명장으로서 도량이 넓고 관대하며, 현명한 사람을 천거하면서도 당사자에게 보답을 구하지 않아 ‘변치 않는 덕을 그르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후세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수양하는 모범이 되었다.
원문발표: 2025년 7월 29일
문장분류: 천인(天人)사이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7/29/497755.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7/29/4977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