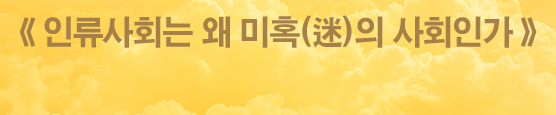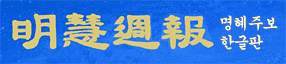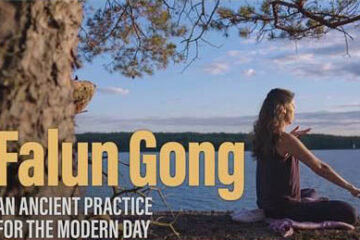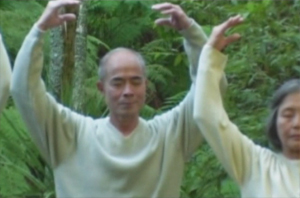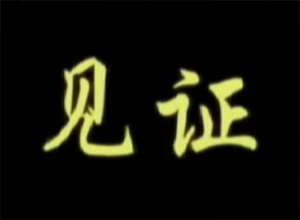글/ 랴오닝성 대법제자
【밍후이왕 2010년 4월12일】나는 98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비록 법을 얻은 지는 여러 해 되지만 잘 정진하지 못해 사부님의 자비 고도를 저버렸다. 나는 최근 수련에서의 약간의 심득체험을 써내어 사부님께 회보하고 동수들과 교류하려 한다.
내 아들은 내가 도맡아 키웠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 애를 연공장에 데리고 가서 법공부하고 연공했다. 그 애는 철이 든 애였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일 하기 싫어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처음에 나는 개의치 않았는데 갈수록 아들의 마성이 심하게 표현됐다. 남들과 마구 싸우기 까지 했는데 그야말로 단속할 방법이 없었고 정신도 이상하게 변했다. 나는 아들이 왜 이런지 생각하면서 이런 변화를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들의 외삼촌, 이모들이 모두 와서 일깨워 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지불했는데 그 아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나에게 대드니 나는 너무도 상심했다. 나는 때로 이렇게도 생각 했다. ‘애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무슨 살 맛이 있는가.’ 동수들은 나에게 안을 향해 찾으라고 해서 나는 한 무더기 되는 집착을 찾았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속인들은 나에게 말했다. “그 아이를 무엇이 조종하고 있는지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세요.”
당시 나는 마음이 조급해 ‘병’이 있다면서 무턱대고 의사를 찾았는데 마음이 좀 움직이면서도 수련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또 한 수련생을 찾아가 교류했다. 아들의 현 상태와 심태를 동수에게 한 번 문의했다. 동시에 동수에게 어디에 가서 물어 보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수련생은 “대법제자가 어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몸에는 부체가 있기에 그렇게 하면 애를 망치게 되요”라고 말했다. 나는 “수련생이 보기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수련 중에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없지요. 당신은 반드시 안을 향해 찾아야 합니다. 아이의 표현은 당신의 무슨 마음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수련 제고를 저애하는 이 집착을 찾아내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아이는 자연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수련생은 내가 아들에 대한 정이 너무 심하다고 일깨워 줬다. 동수의 타이름은 나로 하여금 문득 크게 깨닫게 했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에서 말씀 하셨다. “수련은 곧 마난(魔?)중에서 수련해야 하며, 당신이 칠정육욕(七情六欲)을 끊어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 담담히 여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당신이 그런 것들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수련해 내지 못한다.” 아들의 표현은 나에게 그 아이에 대한 정의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 아닌가? 돌이켜 보면 내가 아들에 대한 정은 너무나 깊은 것이다. 겨울이면 추울까봐, 여름에는 더울까봐 두려워 했으며 일하면 힘들까봐 두려워 했다…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아들의 몸에 퍼 부었다. 아들에 대해 이렇게 집착하니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원만할 수 있겠는가? 아이가 순조롭지 못하니 아이의 몸에서 찾았는데 이는 밖을 향해 구하는 것으로서 법대로 하지 않았다. 수련인의 표준으로 자신을 가늠하자 비로소 인식할 수 있었다. ‘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자신을 잘 수련하지 않는다면, 아들은 좋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법리로 자신을 바로 잡은 후, 아들에 대한 일체 집착을 내려놓고 정념으로 자신과 아들 배후에 좋지 않은 요소를 제거했다. 그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은 곧 변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철이 들고 말을 잘 들었다. 그리고 스스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수련되지 못한 면이 매우 많으며, 사부님의 요구와 거리가 매우 멀다. 나는 앞으로 수련의 길에서 법을 사부로 모시면서 각종 집착을 닦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중생을 구도해 자신의 서약을 실현할 것이다.
부족한 곳에 대해 동수들의 자비로운 시정이 있기를 희망한다.
문장 완성: 2010년 4월 12일
문장 분류: 수련 마당문장 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4/12/2213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