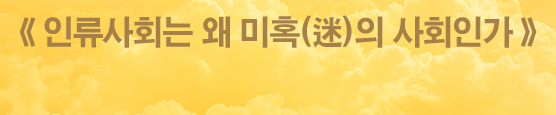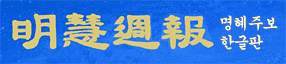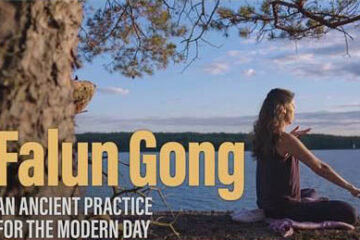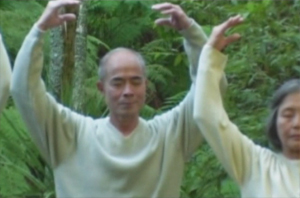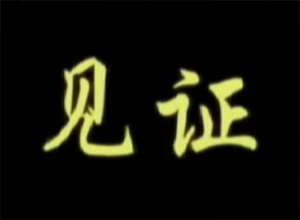글 / 하북 대법제자
[명혜망 2008년 1월 7일] 명혜주간 306호에 실린 ‘농촌 동수들에게 몇 마디’란 문장에 이런 글이 있다.
“사부님의 설법에서, 우리의 수련은 사업을 지체시키지 않으며, 수련을 잘하면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다. 가령 우리가 다만 사람의 사지에만 의거하여 일하고 사업한다면 어떻게 한다 해도 속인을 초월할 수 없다. 일하는 효율의 높고 낮음은 다만 당신의 사지 운동의 빠르고 늦음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런데 수련인은 속인과 같지 않다. 하물며 우리는 대법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해를 수련하였으므로 우리에게는 초상적인 능력이 있다. 만약 우리가 수련에 정진하며 시시각각 사존님이 요구하신 세 가지 일을 첫 자리에 놓는다면 우리의 노동, 사업은 반드시 초상적일 것이며 우리의 농작물, 우리의 수입도 수련으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단락의 말은 나에 대한 계발이 아주 커서 나로 하여금 수련 중의 많은 상황을 회상하게 하였다. 참으로 세 가지 일을 잘하면 일체 모두가 순조롭지만 세 가지 일을 잘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없고 시간을 지체하게 된다. 금년과 작년의 봄 파종이 바로 뚜렷한 대비이다.
작년에 옥수수 점파를 할 때 2무 3푼에 해당하는 밭을 3~4일 동안 작업했는데, 새벽에 일어나고 어두워서 돌아갔으며 비가 내려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허리와 다리가 아파도 밭에 서서 집에 가지 않았다. 결국 법공부, 연공할 시간이 없었으며 발정념, 진상 알리기는 더구나 말할 것도 없었다. 시간을 모두 지체하였고, 또한 힘들기란 말이 아니었다.
금년에는 2무 7푼에 해당하는 밭에 이틀간 점파하였는데 점심에는 집에서 한 시간 정공을 연마하고 평소에는 아침에 연공, 법공부 하고 저녁에 연공장에 가서 동공을 연마하고 법공부 하였으며, 사부님께서 하라고 하신 세 가지 일을 모두 하였더니 몸이 가볍고 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날씨가 추워졌으나 불을 지피기 싫었다. 석탄이 드는게 아까웠고, 시끄럽게 여겨졌다. 이런 고려, 저런 집착으로 결국 게으른 마성이 틈을 타게 하였다. 이 며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났으며 이불속으로 기어들어도 추워 견딜 수가 없었다. 여러 날 동안 아침연공을 하지 않았고, 세 가지 일도 잘 하지 않았으며, 가을이 지나서부터 지금까지 바쁘게 보내다가 12월 2일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다. 이날 아침에 일어나 연거푸 두 번이나 불을 지폈는데, 7시 반부터 열 시가 넘어서야 겨우 불을 지펴 칼국수를 먹을 수가 있었다. 그것마저 더운 물에 익혀 먹을 수 있었을 뿐이다. 나는 눈물을 떨구었다. 마음속으로 사부님의 가지를 청구하는 한편 결심을 내렸다. 더이상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며, 마성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아무리 추워도 일어날 것이며, 더이상 사부님께서 나 이 못난 제자 때문에 속을 태우게 해서는 안 되며, 사부님의 자비로운 고도에 어긋나지 말고 반드시 정진하여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12월 3일 아침 3시 40분 제때에 일어나 연공하였다. 지금은 온돌도 뜨근뜨끈하고 불도 꺼지지 않고 있다.
내가 이러한 지나간 일을 쓰는 것은 나처럼 게으른 동수들에게 어서 빨리 정진하라고 알려주고자 함에서이다. 더이상 나처럼 사부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 것이며, 우리의 사전 대원을 완수하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고도에 어긋나지 않기 위하여 어서 빨리 정진해야 한다. 사부님께서는 매번 설법마다 거듭 우리에게 법공부를 많이 하라, 법공부를 많이 하라, 법공부를 잘 하라고 당부하셨다. “법은 일체 집착을 타파할 수 있고, 법은 일체 사악을 타파할 수 있으며, 법은 일체 거짓말을 타파할 수 있으며, 법은 정념을 확고히 할 수 있다.” (《교란을 제거하자》) 동시에 사부님의 경문, 《최후일수록 더욱 정진하자》, 《뜻을 굽히지 않노라》 등을 많이 읽어야 한다. 오직 부단히 법공부 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정진상태를 보장할 수 있다.
문화수준이 제한된 원인으로 부당한 곳이 있다면 동수들께서 자비로 시정해주기 바란다.
문장발표 : 2007년 1월 7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08/1/7/1697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