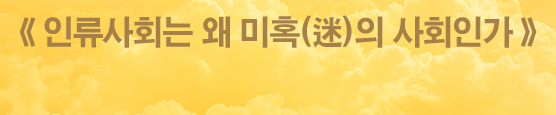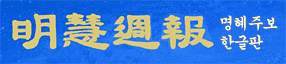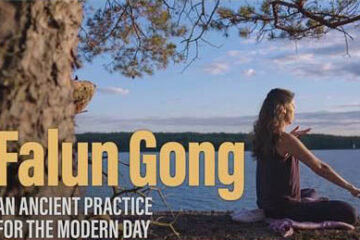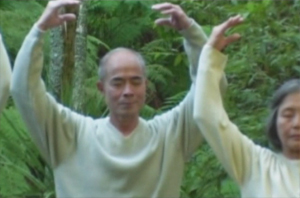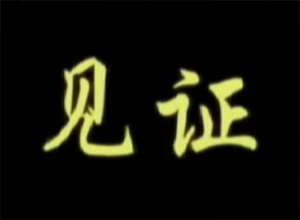—호대희공, 피중취경, 지난이퇴
글/ 일언(一言)
[명혜망] 우리 대법제자에게 ‘진선인(眞·善·忍)’은 심성 수련의 지침이다. 우리의 수련은 속인 중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속인 중의 좋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우리 모두 알다시피 구(舊) 우주에는 성·주·괴·멸(成住壞滅)이 있고, 나중으로 갈수록 편차가 커진다. 중국의 각 조대(朝代)도 성·주·괴·멸이 있어 한 조대가 저물면 다른 조대가 등장한다. 인간 세상에는 상생상극(相生相克)의 이치가 있어 좋고 나쁨이 서로 비추고 정사(正邪)가 공존하므로,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반드시 진정한 기준은 아니다. 그것들은 마치 강물 위의 부표처럼 수면의 높낮이에 따라 변화한다.
수련은 속인 중의 좋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 속세의 때를 모두 씻어내고 선천의 본성이 다시 자신 생명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주 특성인 진선인에 따라 올바른 ‘좋은 사람의 기준’을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몇 가지 성어를 통해 사고와 탐구의 한 측면을 열어보고자 한다. 이 어휘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속인 사회에서나 우리 대법제자가 수련하고 법을 널리 알리며 진상을 알리고 박해에 반대하는 각종 활동에서 실례를 찾기 어렵지 않다.
1. 과시심: 호대희공(好大喜功)
의미: ‘호대희공(好大喜功)’은 중국어에서 큰일을 하려 하고 명리(名利)와 성과를 추구하며 언행이 허황되고 높은 이상만 추구하는 사람을 형용한다. 과시욕이 강한 사람은 흔히 ‘고명조예(沽名釣譽, 헛된 명예를 사고 칭찬을 얻는 것)’에 열중한다. ‘고(沽)’는 사는 것이고 ‘조(釣)’는 미끼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으로 속이는 것을 비유한다. ‘고명(沽名)’과 ‘조예(釣譽)’ 두 단어를 합치면 각종 수단으로 허위적인 영예와 칭찬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예문:
– 예문1: 그는 이런 호대희공하는 사람이라 3할의 성과도 10할로 부풀려 말한다.
– 예문2: 허영심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호대희공하며 자기표현 욕구가 강하다.
– 예문3: 옛날 한나라 무제는 호대희공했다.[나필(羅泌) 『노사(路史)』]
여기서는 단지 예문을 인용했을 뿐이다. 한무제가 실제로 과시욕이 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반의어: 호대희공의 반의어로는 각답실지(脚踏實地, 착실함), 여세무쟁(與世無爭, 세상과 다투지 않음), 온찰온타(穩紮穩打, 차근차근) 등이 있다.
우리 수련인 집단에서 늘 독특함을 추구하고 요란하게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과시욕에 빠진 것은 아닐까? 과시욕은 실제 효과를 중시하지 않아 실수(實修)와 정반대다. 바꾸지 못한다면 기회와 인연을 헛되이 낭비할 것이고, 진상이 드러날 때 후회해도 늦는다.
2. 책임회피: 피중취경(避重就輕)
의미: ‘피중취경(避重就輕)’의 뜻은 무거운 책임은 피하고 가벼운 것만 골라 맡는다는 것이다.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거나 간단한 문제만 처리해 책임이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을 형용할 때도 자주 쓴다.
예문:
– 예문1: 그는 문제를 토론할 때 늘 피중취경해서 사소한 세부사항만 말한다.
– 예문2: 신이 그의 말을 살펴보니 깊은 뜻이 있는 듯하나, 매번 번번이 피중취경해 이해관계를 직접 말하려 하지 않으니, 충신이 할 일이 아닌 듯하옵니다. 폐하께서 살피시어 국가 대계를 그르치지 마소서. (사마광 『자치통감』)
– 예문3: 그러나 그 논의가 대부분 피중취경해 시대의 폐단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고, 단지 문사로 임금의 환심을 사려 할 뿐 국사에 실익이 없어, 결국 여론이 분분해 민심을 얻기 어려웠다. [장정옥(張廷玉) 등 『명사(明史)』]
반의어: 피중취경의 반의어로는 용어담당(勇於擔當, 용감하게 담당), 직면문제(直面問題), 임로임원(任勞任怨,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다) 등이 있다.
우리 대법제자는 오늘날 서약을 이행하러 세상에 내려왔고 모두 거대한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마지막 이 한 생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후퇴해 사람의 관점으로 수련과 책임을 바라보게 됐다.
청나라 건륭 시기 사고전서 편수관을 지낸 요내(姚鼐)는 「등태산기(登泰山記)」라는 글을 썼다. 작가는 친구와 함께 바람과 눈을 무릅쓰고 태산을 유람했는데, 길 내내 짙은 안개가 자욱하고 얼음이 얼어 미끄러워 돌계단을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끝까지 견뎌 산정상에 도달한 후 본 경치는 산기슭에 앉아 손난로를 끼고 한담할 때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장관이었다.
사부님의 「태산에 올라(登泰山)」를 읽으면 진수하는 제자라면 누구나 몸소 체험하는 느낌이 들 것이다.
높은 계단 천척길을 오르나니
가파른 굽이굽이 발걸음이 더디네
고개를 돌리니 마치 정법수련을 보는 듯
반공중에 멈추면 제도받기 어렵도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만근다리 옮기나니
괴로움을 참고 정진하며 집착을 버리네
천백만 대법제자
공성원만 이뤄 높은 곳에 있도다
3. 어려움 앞에서 후퇴하다: 지난이퇴(知難而退)
의미: ‘지난이퇴(知難而退)’의 원래 뜻은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능력이 제한적임을 알고 포기하거나 물러나는 것이다. 또는 전투 시 임기응변해 형세가 불리하면 먼저 퇴각해 단기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나중에는 어려움을 만나면 물러나고 극복하려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
예문:
– 예문1: 어려움과 압력 앞에서 그는 자신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난이퇴를 택했다.
– 예문2: 신이 듣기로 나아감에는 예(禮)가 있고 물러남에는 의(義)가 있으니, 어려움을 알고도 나아가는 것(知難而進)도 의요, 어려움을 알고 물러나는 것(知難而退)도 의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살피소서. (사마광 『자치통감』)
– 예문3: 지난이퇴함은 겁쟁이가 아니라 시세를 살펴 대국을 보전하는 것이니 지혜로운 자가 하는 일이다. (진수 『삼국지』)
반의어: 지난이퇴는 지난이진(知難而進, 어려움을 알고도 나아감), 계이불사(鍥而不舍, 쉬지 않고 새기다), 금강부동(金剛不動) 등이 있다. 그중 ‘금강부동’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며, 각종 변화와 교란에 직면해도 초심을 지키고 내심의 평온과 확고함을 유지하며 외부 영향으로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려움 앞에서 물러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력을 보존하고 손실을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고생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는데 이는 “고생을 낙으로 삼노라”(『홍음』)가 아니다. 수련 중 어려움을 만나면 하고 싶지 않아지고, 갈등을 만나면 소극적이 되며, 배워야 할 때 포기하고, ‘나는 했다’에 만족한다… 사실 서약을 위반하는 결과는 속세의 어떤 고통보다 무섭다. 세상에 내려올 때 우리는 얼마나 장엄하고 신성한 신념을 품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끝까지 견지하고 초심을 바꾸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글에서 열거한 세 가지 성어는 중국어 어휘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좋은 사람의 기준과 전통은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도덕이고, 신께서 전하신 지혜이며, 인류가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보장이고, 수련인이 원만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정법 수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람이 되어 “참말을 하고, 참된 일을 하고, 참된 사람이 됨”(『전법륜』)에 정말 더 이상 그렇게 많은 ‘거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글로 수련생들과 교류하고 반성하며, 서로 촉진해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
[수련인들 간의 이성적인 교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당시 수련 상태에 대한 인식일 뿐이며, 선의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제고하려는 것이다.]
원문발표: 2025년 8월 1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8/16/498401.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8/16/4984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