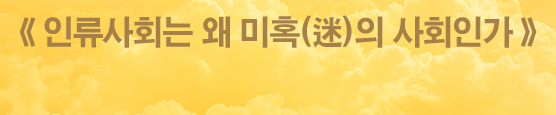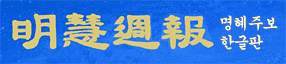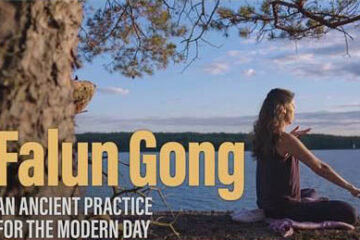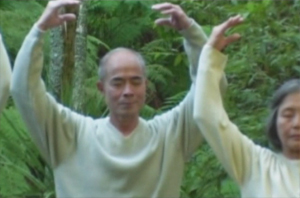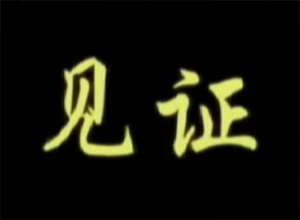글/ 여남(予楠)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 집권 후, 혼인 의례는 ‘개조’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혼례복의 변화뿐 아니라 증혼인도 하늘, 땅, 부모에서 ‘당지부 서기’로 바뀌었고, 결혼 날짜는 ‘5·1’, ‘10·1’ 같은 중공 기념일로 정해졌으며, ‘천지에 절하기’는 ‘마오 초상에 절하기’로 대체됐다. 그러나 중국 고대에는 혼례를 ‘천지에 절하기(拜天地)’라고 불렀다.
‘천지에 절하기’에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 고대 황제들은 태산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고, 베이징의 천단(天壇)과 지단(地壇) 명청 시대 황제들이 천지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중국 고대의 혼례에서도 ‘천지에 절하기’를 했기에, ‘천지에 절하기’가 곧 ‘혼례’를 뜻하는 일상적인 표현이 됐다.
1. 혼례가 예의 근본이 된 유래
《통전·예전(通典·禮典)》의 기록에 따르면, 상고시대에 복희 씨가 혼인 예법을 제정했다. 서주 시대에 이르러 《예기(禮記)》는 혼인 의례를 상세히 기록했다. “천지가 합해야 만물이 생겨난다. 혼례는 만세의 시작이다.” 천지가 서로 어우러져야 만물이 생겨나듯, 남녀가 혼례를 치르는 것은 자손 대대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말하길, 혼례는 예의 근본이다.” 혼례는 모든 예법의 근간이라는 뜻이다.
옛사람들은 “남녀에 구별이 있어야 부부에 의리가 있고, 부부에 의리가 있어야 부자간에 친함이 있으며, 부자간에 친함이 있어야 군신 간에 올바른 관계가 있다”고 여겼다. 부부의 의리는 부자간의 친함과 군신간의 올바른 관계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혼약에서 혼례까지 모든 과정을 매우 엄숙하게 여겼다. 그리고 “혼례는 예의 근본이다”라고 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혼인은 가정의 시작이며, 혼례는 가풍과 가정교육의 출발점이자 남녀 양가가 새로운 인척관계를 맺고 새로운 친인척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시작점이다.
2~3천 년 전 서주의 주공(周公)이 예법을 제정한 후, 결혼에는 정식이고 엄숙한 규범인 ‘육례(六禮)’가 생겼다(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영). 납채(納采)는 남자 측이 중매인을 통해 마음에 둔 여자 집을 방문해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다. 문명(問名)은 여자 측이 동의하면 중매인이 남자를 대신해 미혼 여성의 생년월일시와 어머니의 성씨를 묻는 것인데, 당시에는 동성끼리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납길(納吉)은 점을 쳐서 미혼 남녀의 생년월일시가 서로 맞으면 혼인을 정할 수 있다. 납징(納徵)은 남자 측이 여자 집에 예물을 보내는 것이다. 청기(請期)는 남자 측이 적합한 결혼 날짜를 점쳐 정하고 여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친영(親迎)은 남자가 직접 여자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다. 예법은 의미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본 황실은 약혼부터 결혼까지 지금도 ‘납채지의(納采之儀)’, ‘고기지의(告期之儀)’, ‘배알지의(拜謁之儀)’, ‘조견지의(朝見之儀)’ 등 일련의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중국 전통문화에서 말하는 예법에 속한다.
2. ‘천작지합’의 참된 의미
현대인들은 ‘천작지합(天作之合, 하늘이 지어 준 결합)’하면 하늘이 맺어준 ‘행복한 결혼’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말도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 의미를 갖게 됐다. 예를 들어 남녀평등, 집과 차 소유, 두 독립된 개체의 결합이지 종속관계가 아님, 딩크족의 자유 중시, 불행한 결혼을 끝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용기 등등이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역대 왕조는 모두 혼인을 대사로 여겼고,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가문의 혈통 계승, 사회의 세대 간 문화전통 전승, 사회 안정성과 질서감 강화의 기초로 여겼다.
‘육례’의 구체적인 예절은 각 왕조마다 복잡하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 그중에서 성혼할 때 남녀가 행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천지에 절하기’다.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 부부 두 사람이 이후로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의리를 지키며, 혼인 생활의 희로애락과 부귀빈천을 함께 맞이하고, 손잡고 늙어가며 죽을 때까지 충절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약속을 지킨 남녀만이 인연 속에서 백년해로하며 ‘천작지합’이라 불릴 자격이 있다. 왜 그럴까?
인연 없이는 혼인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연이 반드시 선연이나 악연만은 아니다. 명말청초 작가 풍몽룡(馮夢龍)의 《경세통언(警世通言)》(1624년)에 이런 말이 있다. “원수가 아니면 만나지 않는데, 원수가 만나면 언제쯤 헤어지랴.” 업력 인과가 없는 사람은 만나도 서로 못 본 척하고 아무 감정이 없지만, 업력 인연이 있는 사람은 피할 수 없이 만나고 상호작용한다. 인연 속에는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갚고 빚을 갚는 것뿐 아니라 원한을 갚는 것도 있다. 혼인연은 곧 인연이고, 하늘이 ‘원수’를 혼인 속에서 인연을 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작지합’의 깊은 의미다.
1) 북송의 유정식이 혼약을 신의 있게 지킨 이야기
북송 시대 제(齊) 지방 사람 유정식(劉庭式)은 정직하고 마음이 넓으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소개를 통해 동향 여인과 평생을 약속했고, 양가는 중매인의 주선으로 혼약을 맺었다. 몇 년 후 예물을 보내 신부를 맞이해 백년가약을 맺기로 했다.
그런데 유정식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 그의 약혼녀가 병으로 두 눈이 보이지 않았다. 온갖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결국 맹인이 됐다. 여자의 집은 농사를 짓는 가난한 집으로 권세도 없어 감히 딸의 혼사를 다시 꺼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여인은 늘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했고, 정해진 혼약이 깨질까 봐 걱정했다.
약혼녀의 변고 소식은 당연히 유정식의 귀에도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농가의 맹인 여자를 맞이하지 말라고 권했다. 평생의 대사를 그르치고 일생의 행복을 망칠 것이라고 했다. 유정식은 웃으며 말했다. “내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허락했소. 비록 그녀가 두 눈을 잃었지만 어찌 당초의 본심을 어길 수 있겠소.” 결국 그는 맹인 여자를 맞이했고, 서로 부축하며 백년해로했다. 사람들은 이를 천고의 미담으로 전했고, 유정식은 당연히 약속을 지키고 혼약을 준수한 모범으로 추앙받았다.
‘천작지합’의 관점에서 보면, 유정식은 전생에 그 여인에게 은혜를 입었을 수 있고, 이번 생은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다. 그는 해냈고, 따라서 두 사람의 ‘천작지합’도 원만한 결말을 맺었다.
2) 청대 진잠원이 남의 혼약을 이루게 한 이야기
청나라 강소성 가정 출신 진잠원(秦簪園)은 과거에 급제했을 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재혼했다. 신혼 첫날밤, 재혼한 여인이 슬피 울며 멈추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여인이 말했다. “저는 어릴 때 이웃 마을 리씨 집 아들과 혼약했는데, 부모님이 리씨 집이 가난하다며 리씨 집에 파혼을 강요하고 저를 개가시켰습니다. 두 성씨를 섬기게 된 것이 부녀자의 도에 어긋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진잠원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말했다. “왜 일찍 말하지 않았소. 하마터면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구려!” 그는 신방을 나와 하인을 시켜 리씨 집 아들을 찾아오게 했다. 리씨 아들이 도착하자 진잠원은 상황을 설명하고 말했다. “오늘 같은 좋은 밤, 두 분이 저희 집에서 혼례를 치르시오.” 그리고 혼례에 쓴 모든 돈과 물건을 그들에게 선물했다. 두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했다. 진잠원이 파혼하고 다른 이들의 결혼을 도운 일은 당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았다. 건륭 28년 계미년에 진잠원은 진사에 급제했다. 황제가 직접 장원으로 뽑아 그는 천하의 으뜸이 됐다.
진잠원은 남의 곤경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의 이전 혼약을 존중하고 이뤄지게 했다. 이런 군자의 덕과 선을 쌓는 행위는 그가 나중에 진사에 급제하고 장원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3) 예법은 ‘봉건적’이지 않다
공자는 《예기》에서 말했다.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禮)가 가장 중요하다. 예가 아니면 천지의 신명을 섬길 수 없고, 예가 아니면 군신, 상하, 장유의 위치를 분별할 수 없으며, 예가 아니면 남녀, 부자, 형제의 친분과 혼인 관계의 친소(親疎)를 구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군신과 상하의 존비(尊卑)가 등급 관념 아닌가, 이것은 봉건 관념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사실 음양의 존비는 천지 운행을 유지하는 천도다. 마치 일 년에 사계절이 정상적으로 순환하고, 악곡에 고중저음이 조화를 이루듯, 천지 음양 자체가 바로 존비 구분의 체현이다. 하늘은 존이고 땅은 비이며, 양은 존이고 음은 비이며, 낮은 존이고 밤은 비이다. 만약 이런 질서가 어지러워져 땅 없이 하늘만 있고, 음 없이 양만 있으며, 밤 없이 낮만 있고, 춘하추동이 무작위로 뒤바뀌며, 모두가 왕이고 백성이 없으며, 모두가 선생이고 학생이 없다면, 그것이 ‘봉건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혼돈과 무질서는 문명의 체현이 아니다.
사실 ‘봉건’이라는 말의 최초 출처는 《시경·상송·은무》의 ‘명우하국, 봉건궐복(命於下國, 封建厥福)’으로, 상왕조가 동족과 이족 방국 제후들을 책봉하는 행위를 가리켰다. 토지를 분봉하고 제후국을 건설한다는 ‘봉토건방(封土建邦)’의 뜻으로 중국 고대의 한 정치제도였지 폄하의 의미는 없었다. 역사가 250년도 안 되는 미국이 채택한 연방제를 민주 시민의식에 기초한 ‘분방건국’ 제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차이점은 자치권을 가진 주지사가 대통령이 임명한 동족이나 이국 제후가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민주선거로 선출된다는 점일 뿐이다.
예는 천지인 삼도를 따르는 윤리로, 이를 따르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혼인의 예는 남녀 예절 중 큰 예이므로 천지의 도리에 순응해 마련하고 실현해야 한다. 현대인들이 혼례를 과시와 허영의 구실로 삼고, 체면을 위해 미래 가정의 경제적 기초마저 무너뜨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은 현대 상업의 조작과 현대인이 전통적 가치 이념을 잃어버린 결과일 뿐이다.
(미완, 계속됨)
원문발표: 2025년 9월 9일
문장분류: 천인(天人)사이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9/9/499239.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9/9/4992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