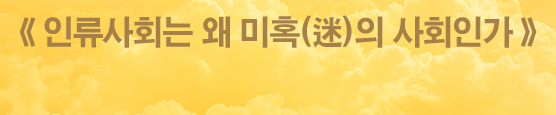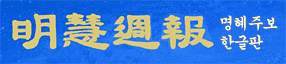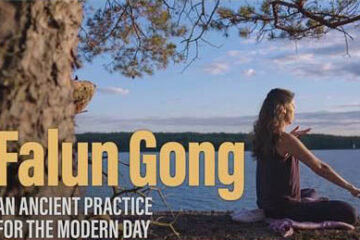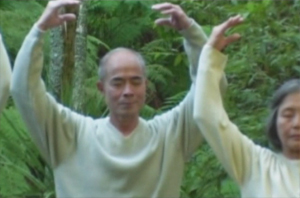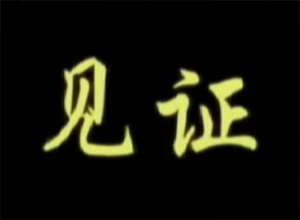글/ 명월(明月)
[명혜망] 1980년대부터 중국의 간체자 체계가 세계 무대에 등장하면서 간체자와 번체자에 관한 논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 40~5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번체자를 보면 반감과 거부감을 느끼는 상태가 됐다. 이는 더 이상 문맹 퇴치나 한자 쓰기의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 전통 계승과 외래 침략이라는 이념 대립에 빠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자 변체(變體), 간소화, 그리고 간체자 제도화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연원과 역사적 배경
1) 한자 변체와 체계적 간소화
한자가 갑골문, 금문에서 소전, 예서로, 다시 해서, 행서, 초서로 변천하면서 점차 획수를 줄이고 쓰기 효율을 높인 것은 천년에 걸친 문화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었다. 한자의 간소화 형태는 이미 진나라(기원전 221~206년) 때부터 존재했는데, 주로 초서나 속기 형태로 나타났고 일상적인 비공식 쓰기에 사용됐다. 이는 실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서예 미학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간체자를 제도화하고 대규모로 시행한 것은 중국공산당(중공)이었다.
2) 의구심을 자아내는 5·4운동
1919년, 수많은 지식인들이 전통 한자를 현대화의 걸림돌로 여기며 문자 개혁이나 간소화를 주장했고, 심지어 ‘한자 폐지’까지 거론됐다. 이는 5·4운동의 발단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자 문제에 있어서 ‘신문화운동’이 중시했던 루쉰(魯迅)과 중공 초기 지도자 취추바이(瞿秋白) 등은 모두 “한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중화는 반드시 망한다”고 외치며 알파벳 문화로 상형문자 문화를 대체하려 했다.
3) 국민정부의 이례적인 행보
1935년 국민정부는 처음으로 간체자 채택을 시도해 324자의 간체자를 발표했으나, 정치계와 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 중단했다.
국민정부는 본토 통치 시기(1920~1949) 중화 전통문화 부흥 입장을 견지하며 유가사상을 지지했고, 1919년 ‘5·4운동’의 전통문화 비판과 서구화 물결에 반대했다. 따라서 1935년의 간체자 시행은 소련과 손잡고 공산당과 연대하며, 공산당원의 개인 자격 국민당 가입을 허용한 것이 가져온 침투의 결과로 의심된다.
4) 한자 간소화 추진에서 중공의 역할
중공은 1949년 10월 중국 집권 후, 1950년대부터 토지개혁, 공사합영, 반우파운동, 인민공사, 대약진 등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중국 사회의 인문 구조를 개조하고 사회 기반을 뒤흔들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한자 간소화를 시작했다.
1956년 1월 31일, 중공 국무원은 ‘한자 간소화 방안’을 공포했다. 이 방안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에서 유행하던 한자 간소화 형태를 정리해 사회용 문자 규범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이후 1964년, 1977년, 1988년, 2013년 등 여러 차례 개정됐다.
어떻든 체계적으로 강제 시행된 간체자에는 중공 이데올로기의 깊은 흔적이 새겨져 있다. 파사구(破四舊), 무산계급 문화대혁명 등의 정치운동을 거치며 1949년 이후 중국 문화 변질의 상징 중 하나가 됐다.
2. 사회와 문화적 영향
1) 한자 ‘간소화’ 원칙의 변질
간체자 간소화의 원칙은 문화적 차원에서 본질적 변질을 겪었다. 중공 이전에는 간체자가 오랜 기간의 속자(俗字), 초서 또는 편의를 위한 변체에서 유래했다. 예를 들어 ‘礼’는 ‘禮’의 간소화 형태였고, ‘云’은 ‘雲’의 초기 형태였다. 하지만 중공 건국 이후에는 쓰기 간소화를 명분으로 삼고 중국 전통문화 이념 근절을 실질 목적으로 문자 혁명을 진행했으며, ‘문혁’ 종료 후에는 이것이 더욱 ‘당연시’됐다.
2) 문화·정치적 상징 의미
번체자는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문화 전승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중국의 정치적·문화적 통일에 대한 일종의 무언의 저항이기도 하다.
3) 전통문화와 미감의 상실
번체자는 더 많은 상형 구조와 역사적 요소, 철학적 이념을 담고 있으며 고전문학, 서예예술, 문화 전승과 불가분의 관계다. 반면 중공이 체계적으로 보급한 간소화 한자는 한자의 획 구조와 자형의 미감을 파괴했고, 한자 구조 속의 역사적·도덕적 요소를 제거했다.
예를 들어 중공의 간체자에서 서주 시대부터 유래한 ‘蔡’ 성씨가 한때 채소의 ‘菜’로 바뀌었고, ‘귀’와 ‘덕’[耳德]을 강조하는 ‘聽’은 입(口)과만 관련된 ‘听’으로 바뀌었으며, 큰 귀와 작은 입의 ‘聖’은 의미를 알 수 없는 ‘圣’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한자 간소화 원칙은 전통문화의 변체자 쓰기 원칙과 크게 어긋난다.
4) 중공의 문화 점령
1978년 12월 18일은 중국 개혁개방의 시작점으로 여겨진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의 실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목하지 못한 점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번체자(정상 한자)를 채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른바 ‘대외 개방’을 이용해 1980년대에 이미 중공의 간체자 체계를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번체자가 홍콩과 대만에서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풍부한 서예와 문화 미디어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국양제’가 중공에 의해 무력화된 후 간체자가 홍콩과 대만에서 번체자의 생존 공간을 점점 더 압박하고 있다. 마치 1950년대부터 중국에서 이른바 ‘한자 개혁’(간체자)을 정치운동과 결합시켜 결국 번체자(진정한 한자)를 소멸시키고 중공 당문화가 중국을 지배하게 만든 것처럼 말이다.
3. 한자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
명심할 점은 한자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간체자든 번체자든 마찬가지다.
간소화 한자가 쓰기 편하고 문맹 퇴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진정으로 해로운 것은 중공이 간체자를 제도화하고 강제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공의 한자 제도화가 실질적으로 달성한 효과는, 중국어의 자유사상, 독립적 사고, 도덕 윤리, 미학적 표현을 중공의 서구 유래 이데올로기의 고정된 틀로 대체해, 중국 사회를 문화 전승 제거, 자유 의식 제거, 독립적 사고 제거의 사회 형태로 변화시킨 과정이었다. 또한 번체자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중화 전통문화와 올바른 인간 이념을 계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념 대립이 번체자와 간체자 문제를 정치화시킨 것은 현대 사회 정치의 타락과 인간 사상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대 중국에서 변체자는 순수하게 심미적 목적이나 빠른 쓰기를 위한 것이었다. 문맹이 글을 모른다고 해서 문화 전승의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엄격한 훈련을 받은 이야기꾼, 희곡 배우, 가문의 대대로 이어지는 구전과 몸소 실천하는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은 올바른 인간의 도리와 역사 고사를 배울 수 있었다.
맺음말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간체와 번체 한자 논쟁은 사실 ‘문화 전승과 변질’, ‘이념과 도덕의 변천’에 관한 심층적 대화다. 간체자는 쓰기는 빠르지만 문화적 가치, 도덕 이념, 미학의 상실을 초래했다. 번체자(정상 한자)는 전통과 미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덧붙여 말하면, 번체자가 쓰기 어렵거나 외우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한자는 본질적으로 그림이며, 인간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전체적으로 식별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기가 부모 얼굴을 보면 즉시 기억할 수 있는데, 이는 얼굴 특징의 복잡함과는 무관하다. 인간의 눈과 뇌는 하늘이 만든 것으로 그 능력이 비범하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간체자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번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중공이 강압적이고 제도적으로 간체자 체계를 추진한 것은 중국인의 전통적 생존 환경과 전통 도덕사상을 박탈하는 데 부인할 수 없는 파괴적 역할을 했다.
원문발표: 2025년 8월 23일
문장분류: 천인(天人)사이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8/23/498678.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8/23/4986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