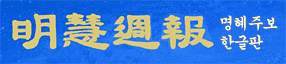-정법수련 속에서 협조한 개인의 체득
글 / 호남대법제자
[명혜망 2009년 7월 12일]
나는 1995년 10월에 법을 얻은 노제자로서, 사존님의 자비로운 가호 하에 비바람 속에서도 거침없이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 정법수련기간에 나는 한 지역의 협조인이 되는 행운을 얻었다. 하지만 부끄러운 것은 아직 수련에 차이가 많다는 것인데, 여기서 내가 직접 겪었던 한가지 일, 즉 어떻게 “간격”을 대하고, 그 간격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 동수들과 교류하려 한다. 나는 정법수련의 마지막 시기에 일부 지역의 협조인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는 정법노정과 서로 부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약간의 체득을 적으려 하니, 벽돌을 던져 구슬을 끌어들일 것을 바라는 바이니 부당한 곳이 있으면 자비롭게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나는 2006년 현지의 갑을 두 협조인과 한 단락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갑수련생은 99년 720이후 줄곧 현지의 총 협조일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 단락의 간고한 세월 속에서 갑수련생은 현지의 대법을 실증하는데 창조적인 사업을 아주 많이 했고, 동수들 사이에서 꽤 위망이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수련생은 그에게 마음에 우러나오는 숭배감이 있었고, 갑동수 또한 확실히 “성취감”이 있었다. 후에 진상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갑수련생을 신고하는 바람에 갑은 핍박으로 유리 실소하게 되어 현지의 총 협조를 을수련생이 책임지게 되었다. 을수련생은 법리적으로 명석하고 용맹정진했다. 가장 귀한 점은 바로 대법에 사심없이 지불하는 마음이었다. 갑수련생이 다른 지역에서 현지로 돌아오기 전까지 을수련생은 경험부족으로 늘 갑동수와 교류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내가 발견한 것은 일종의 무형의 요소가 그 두 사람사이에 간격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제삼자인 나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나의 몸에 그런 자아를 고수하려는 집착이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이리저리 찾았으나 나는 그래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곧 생각하기를 나더러 갑을사이의 관계를 조절하고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라는 게 아닐까? 을동수도“안을 향해 찾으려”노력하고 있었으며, 여러 차례 우리는 서로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무슨 집착이 있는지 교류하였다. 당시 나도 얼떨떨하여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알라고 하는지 몰랐고, 무엇을 제고하라는 것인지 몰랐다. 후에 두 명의 수련생이 늘 그들과 자료를 만드는 일로 자주 만났는데, 이들도 이런 “간격”을 느끼고 있었는지, 하는 말 모두 을수련생을 인정하는 편이었다. 특히 갑수련생은 여러 차례 아내를 데리고 자료점을 드나들었는데, 몇 번이나 지적해도 고쳐지는 법이 없자 모두 그에 대한 견해가 있었다. 나도 당시에 우리가 너무 갑한테 의뢰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갑을 너무 중하게 보고 있어서 사악이 마침 이 틈을 타고 “간격”을 만든 게 아닌가? 나는 곧 을동수와 교류를 하여 갑동수 더러 “좀 쉬게”하자고 하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다. 이 상태로 발전되다 보니 심지어 갑수련생은 주동적으로 동수들과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회사를 차리고는 수련하는지 마는지 하였다. 비록 현지의 정법형세가 이로 인해 손실은 없었으나 갑에 대한 의뢰에서 벗어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숙해 졌다. 하지만 공동으로 제고할 수 있는 한 차례 기회는 잃었다.
최근 모 법공부 소조팀에서 신운VCD를 배포하는 일을 협조하면서 근거리 발정념으로 수련생을 구출하는 문제로 병동수와 의견이 달랐다. 그러자 그 동수에 대한 견해가 있어서 그 수련생을 원망하였다. 나는 그제야 몇 년 전에 “간격”에 대한 고비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근본에서 이성적으로 승화하지 못했음을 발견하였다. 나는 깊고 깊이 뿌리 내린 고유의 관념을 개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사람 마음인 열정으로 대법의 일을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티끌만한 차이였으나 천리만큼 삐뚤어져있었다. 그럼 “간격”에 대해 협조인인 나는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1, 협조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교류를 주선하는 것은, 우선 마음을 조용히 하고 법공부를 하여 자신을 닦는 것보다 못하다.(물론 급한 일을 통지하고 협조하는 것을 제외하고) 협조는 속인의 열정에 의거해 책임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협조는 일에 봉착해 안을 향해 찾으며, 안을 수련하여 밖이 안전한 것으로서, 감성인식에서 이성 인식으로 승화하는 과정이다. 법에서 수련하지 않으면 협조할수록 더욱 다망해지고, 일에 봉착해 자신을 수련하면 협조하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 조절된다.
2, “간격”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법공부를 잘하여 진정으로 안을 향하여 찾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오늘에 이르러 아직 나는 감히 안을 향해 찾을 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마치 앞에서 언급했던 동수의 “간격”을 보면서, 나 자신한테서 뭘 찾아야 하는지 가늠하기 힘들며, 심지어 한무더기를 찾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혹은 자신의 관념 속에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혹은 일을 논하는데 그치거나, 구두 신고 발등 긁기로 찾다보니 나중에는 갑으로 하여금 점점 더 멀어지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존님께서 >에서“책임자가 문제가 있으면 틀림없이 책임이 큰데 이 한 점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 사부는 무수한 법신(法身)이 있어 모두 관여하고 있는바 틀림없이 그의 문제를 놓아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가 제고할 기회를 놓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지나치게 그의 문제를 집착한다면 역시 이 일을 통해 당신의 문제를 폭로할 것이며, 당신으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 당신더러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여 그의 문제를 아마 당신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잠시 해결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럼 더욱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이 일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데, 좋다, 그럼 이 일을 통해 모든 문제들을 몽땅 폭로시켜 당신들더러 보게 한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부의 법신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더욱 명백해져야 하며, 일에 봉착하여 곧 자신을 찾으며 자신을 수련해야지 절대 동수의 집착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3, “간격”이 있는 동수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말해보자. “자비는 신의 영원한 상태이다”동수의 표면이 어떠하든지 모두 정념으로 가지해주어야 하며, 자비로 대해야 하며, 예전과 다름없이 홍대한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 앞에서 제기 된 갑동수에 대해 우리는 견해가 있었고 “좀 쉬도록”하려는 생각이었는데, 모두 수련생을 아래로 밀어뜨린 것이었지,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입장에서 갑수련생을 고려한 것이었던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건 자비이다. 사부님께서는 무변의 방법이 있으니,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사부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집착할 바가 아닌 것이다.
4, 뿌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외재적인 수단이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치 속인들이 수술로 외적인 종류를 베어냈으나, 다른 공간의 병업의 근본을 움직이지 못해 때가 되면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보았을 때, 동수간에 “간격”이 나타나면 많게는 안을 향해 찾아서 수련하지 않고, 마치 세간소도에서 수련하는 사람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희망이 없어지면서 점차 그런 마음이 닳아 없어지는 것과 흡사함을 보아냈다. 경우를 바꾸었을 때 동일한 문제는 가능하게 또 기타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마치 자신이 갑, 을 동수와 접촉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집착을 찾아내지 못하다가, 금년에 이르러 병동수와 접촉하면서 동일한 집착이 또 부동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던 것과 같다. 때문에 “간격”이 있을 때 안을 향해 찾고 마음을 닦아 씬씽제고를 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것이다. 어떠한 외적인 방식은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으나 영원한 것은 개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체득을 쓰는 게, 많은 것은 작은 구멍을 통해 내다 본 것으로, 다만 정체적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정념으로 “간격”을 제거할 것을 바라며, 진정으로 금강부동의 정체가 이루어지길 바랄뿐이다.
문장완성: 2009년 7월 10일
문장발표: 2009년 7월 12일
문장수정: 2009년 7월 12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정법수련 이성인식사이트주소:http://minghui.org/mh/articles/2009/7/12/2043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