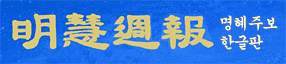<중앙일보 기사>
“中 언론감독 기구는 중세 교황청”
베이징大 교수, ‘중앙선전부’ 비판 논문 파문
▶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열렸던 지난 3월 초 랴오닝성 등 외지에서 베이징으로 몰려든 인민들이 억울한 사연이 적힌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아주주간 제공]
어제(3일)는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정한 ‘언론자유의 날’이다. ‘언론자유의 날’이 있다는 건 언론자유가 없는 땅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중에서도 아시아가 가장 큰 골칫거리다. 상당수 국가의 언론이 국가 통제 속에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침묵의 카르텔’을 흔들 ‘작은 지진’ 하나가 발생했다. 진앙지는 수도 베이징(北京)이다.
‘다이쉐(待雪)’. ‘눈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눈(雪)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안기 때문일까, ‘다이쉐’엔 ‘원한이나 억울함이 풀리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지금 중국 전역은 ‘다이쉐’로 덮여 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억울한 사연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썩은 관리, 힘 있는 자들 탓에 품게 된 한이다. 그래도 힘없는 인민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다. 고작 ‘천위안다이쉐(沈寃待雪.억울한 사연을 풀어 달라)’, ‘위안왕'(寃枉.억울하다) 등이 쓰인 종이판을 들고 정부 청사 앞에 쭈그려 앉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상팡'(上訪.탄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중선부(中宣部) 때문이다. 중선부는 ‘중공(中共.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의 약칭이다. 중국 내 모든 언론매체를 감독한다. 중국 언론엔 염라대왕 같은 존재다. 중선부의 보도 지침은 어길 수 없다. 지금껏 누구도 중선부에 대항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현직 교수가 ‘중선부를 토벌한다'(討伐中宣部)’는 제목의 논문을 인터넷에 띄웠다. 중선부에 대한 첫 공개 도전이다. ‘중선부’라는 탱크를 단신으로 가로막고 나선 인물은 베이징대 신문방송학과의 자오궈뱌오(焦國標.41)교수다.
?뛰어난 왜곡 솜씨=焦교수는 논문에서 ▶중선부의 14가지 큰 병과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14가지 큰 병을 보자.
첫째, ‘무당을 박수로 만들기’다. 중선부에 걸리면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도 없는 것이 된다. 언론은 중선부의 수많은 ‘부쉬'(不許.보도금지)에 길들여 있다. 둘째, ‘로마교황청화’다. 중선부의 권위는 중세의 교황청과도 같다. 누구도 맞설 수 없다. 셋째, ‘일본 문부성화’다. 일본 문부성은 틈만 나면 역사를 왜곡한다. 왜곡 방면이라면 중선부는 문부성보다 뛰어나다. 넷째, ‘헌법 살해’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중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중선부는 언론자유를 ‘1000가지 방법 100가지 계략(千方百計)’을 동원해 철저하게 짓밟았다. 焦교수는 대책으로 상책과 하책 두 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중선부 폐지다. 하책은 ‘선전부 공작법’제정이다. 이를 통해 중선부를 감독하자는 제안이다.
焦교수의 논문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정부와 언론계는 바짝 긴장했다. 결국 베이징대 교무 책임자가 焦교수를 불렀다. 그는 “중선부가 개입하면 골치 아파진다”며 “당분간 해외에 나가 연구하라”고 권했다. 焦교수는 거절했다. 교직을 빼앗기면 허난(河南)성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짓겠다고 대답했다. 아직까지 焦교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일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언론자유는 대세=지난달 초 광둥(廣東)성에서 ‘중국 제일 신문’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의 위화펑(喩華峰)총경리가 긴급체포됐다. 곧이어 19일 광저우(廣州)법원은 그에게 12년형을 선고했다. 죄목은 회계부정과 횡령. 같은 날 광저우시 공안 당국은 쓰촨(四川)성 간쯔(甘孜)현, 장족(藏族)자치구 내 단바(丹巴)현까지 달려가 그곳에서 회의를 주재 중이던 청이중(程益中) 남방도시보 총편집을 체포해 압송했다. 죄명은 뇌물수수와 횡령이었다.
두 사람의 변호를 맡은 쉬즈융(許志永)변호사는 “이번 수사는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발생을 첫 보도하고 관리들의 잔혹 행위를 알리는 등 날카로운 비판을 선도해온 남방도시보에 대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 내 언론자유는 대세다. 이유는 언론의 독립채산제다. 과거처럼 국가지원에 기대하던 때는 지났다. 이젠 언론 스스로가 수지를 맞춰야 한다. 당(黨)이 아니라 독자가 왕이다. 그렇다면 정부 비판과 비리 폭로는 기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채찍만 앞세운다면 중선부의 서슬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중국 언론의 ‘다이쉐’는 그리 요원해 보이지 않는다.
진세근 기자
.
2004.05.03 18:12 입력 / 2004.05.03 18:24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