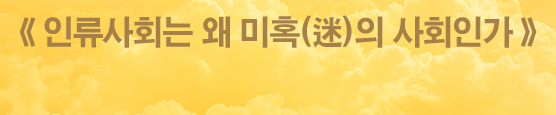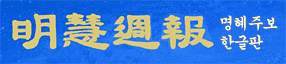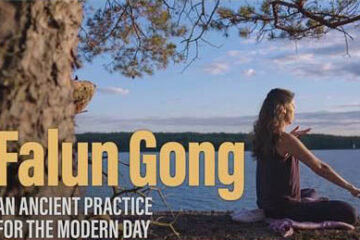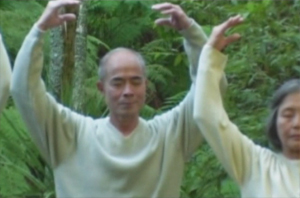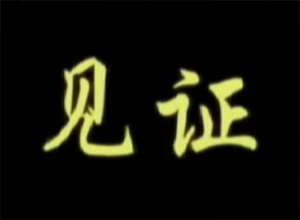[명혜망] 중국은 예로부터 ‘신주(神州)’ 대지로 불리며 풍부하고 다채로운 신전(神傳)문화를 연출해왔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사찰, 도관, 교회는 ‘문화관광 프로젝트’가 돼 각종 기발한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어떤 곳은 온 산에 각종 기이한 신상(神像)을 세워놓고 관광객과 사진을 찍으며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 명산대천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예전의 속세와 동떨어진 청정한 수련 장소는 오늘날 ‘돈 찍는 기계’와 중국공산당(중공)의 정치 도구로 변했다. 인터넷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갈수록 ‘수련’이라는 단어를 비웃거나 멋 부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련의 신성함을 모독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 승려와 도사,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장소마저도 온갖 거래의 대상과 장소가 됐지만, 1949년 이전만 해도 이 천백 년 된 고대 사찰과 도관은 여전히 불도(佛道)를 닦는 자들이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해 나아가며 마음을 맑게 하고 집착을 버리는 정토였다. 오늘 우리는 수련의 진정한 내포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논하지 않고,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수련’이라는 두 글자가 담고 있는 무게를 살펴보려 한다.
(전편에 이어)
현종의 도 홍양
장과로(張果老)는 ‘팔선(八仙)’ 중 한 명으로, 그가 ‘당나귀를 거꾸로 타는’ 형상은 민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신화전설 속 인물로 여기며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4사(二十四史)·구당서(舊唐書)》에는 장과(張果)가 실존 인물로 중조산(中條山)에 은거했다고 기재돼 있다. 무측천(武則天, 측천무후)이 그를 불렀지만 그는 사신 앞에서 죽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가 항주(恆州) 산중을 왕래하는 것을 다시 보았고, 항주 자사(刺史)가 조정에 상주하자 당현종(唐玄宗)이 사람을 보내 그를 몇 번이나 청해서야 그는 당현종을 만나러 왔다.
당현종은 장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점술에 능한 사람을 불러 장과를 점치게 했지만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고 “멍하니 그의 생년조차 알 수 없었다”고 했다. 현종은 다시 장과를 병풍 뒤에 앉힌 채 ‘천안통(天眼通)’을 가진 술사를 불러 보게 했지만 그 역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당현종은 맹독성인 투구꽃 즙을 가져와 장과에게 연달아 세 잔을 마시게 했고 그는 잠이 들었다. 깨어나 거울을 보니 이가 모두 검게 변해 있었다. 현종은 철여의(鐵如意)를 가져오게 해 썩은 이를 모두 쳐내게 했고, 장과는 품속에서 약을 꺼내 잇몸에 바른 뒤 다시 잠시 잠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후 그의 이가 모두 자라나 있었고, “희고 반짝이며 고르게 나 있어 현종은 비로소 믿었다.” 새하얀 이를 보고 당현종은 그가 신선임을 믿게 됐다.
장과는 자신이 ‘희황(羲皇)’ 연간(역주: 복희씨가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기원전 2800년경)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일부 도법의 행지(行旨)를 논했다. 나중에 장과가 산으로 돌아가자 현종은 그를 위해 서하관(棲霞觀)을 지었고, 소재지인 ‘포오현(蒲吾縣)’을 ‘평산현(平山縣)’으로 개명했다.
《구당서》는 오대(五代)에 편찬된 관사로 당나라와 더 가까워서 사실 기록이 비교적 생동적이다. 그러나 송나라에서 《신당서》를 편찬할 때 구양수(歐陽修)는 매우 엄격한 사람으로, 유가 사서에 이런 신기한 일을 너무 부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구당서》의 많은 생생하고 생동적인 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장과의 사례는 상세하고 믿을 만해서 기본적으로 보존했으며, 장과의 출생 연도도 보충했다. “나는 요제(堯帝) 병자년에 태어났으며, 시중(侍中) 벼슬을 지냈다.”
송나라 공식 편찬 유서(類書)인 《태평광기(太平廣記)》에는 사관이 너무 신기해 사서에 기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긴 내용을 완전히 수록했다. 당현종이 사냥을 나가 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요리사가 막 사슴을 죽이려 하자 장과가 말했다. “이것은 선록(仙鹿)으로 이미 천 살이 됐습니다. 이전 한무제 원수(元狩) 5년에 제가 시종이었을 때, 무제가 상림원에서 이 사슴을 생포한 후 바로 놓아주었습니다.”
현종이 “사슴이 많고 시대가 변했는데, 어떻게 이 사슴이 그때 그 사슴인지 알 수 있소?”라고 하자, 장과는 “한무제가 그 사슴을 풀어줄 때, 왼뿔 아래에 동판을 걸어 표식으로 삼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종이 사람을 시켜 확인해 보니 과연 2촌 정도의 작은 동판이 있었고 그 위에 연월이 적혀 있었다.
현종이 다시 장과에게 “원수는 어느 해이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소?”라고 묻자, 장과는 “그 해는 계해년으로 무제가 막 곤명지(昆明池)를 파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올해는 갑술년이니, 이미 852년이 지났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종이 태사에게 연력을 검토하게 했더니 조금도 차이가 없어 그는 더욱 신기하게 여겼다.
진·한 시대에 진시황과 한무제는 모두 도법을 깊이 믿었으며, 사람이 수련을 통해 반본귀진(返本歸眞, 진정한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감)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겼다. 진시황은 서복(徐福)을 바다로 보내 선도(仙道)를 찾게 해 천고의 기담이 됐다. 한무제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그 자신은 평생 신선의 도를 사모했다. 정사에는 그가 득도한 수련자와 만난 기록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는데, 삼교가 막 흥기할 무렵 교화를 보급하고 도덕을 함양하는 것이 근본이었으니, 어쩌면 때가 되지 않았거나 기연(機緣)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당나라 초기, 당태종은 넓은 도량을 가졌고, 모든 것을 포용했으며, 유학을 정통으로 삼고 삼교를 함께 중시하는 포용 원칙을 시행했다. 당태종은 일찍이 “짐이 지금 좋아하는 것은 오직 요순(堯舜)의 도와 주공(周孔)의 가르침뿐이다”라고 말하며 유학이 국가의 근본임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당태종은 불교와 도교도 숭상했는데, 그는 “노군(老君, 노자)이 남긴 모범은 맑고 비움에 있고, 석가가 남긴 가르침은 인과(因果)의 이치에 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이끄는 길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의 근본을 추구하자면 널리 이로움을 베푸는 정신은 같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교와 도교가 마음을 정화하고 풍속을 순후하게 하는 교화의 공이 있다고 여겼다. 현장(玄奘)이 서역으로 가서 불법을 구하고 돌아오자 당태종은 그를 중시해 불경 75부, 1335권을 번역하게 했고, 불교는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태종 이후, 군주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삼교 가운데 어느 하나에 더 치우쳤지만, 대체로 각자의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었다.
당현종 시대에 이르러 도교는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했다. 개원(開元) 9년(서기 721년), 당현종은 사마승정(司馬承禎)을 수도로 맞이해 친히 법록을 받아 도사 자격을 취득한 첫 번째 황제가 됐다. 개원 10년(722년)에는 양경(兩京, 장안과 낙양)과 각 주에 노자를 숭상하는 현원황제묘와 도교 학생을 배양하는 학교인 ‘숭현학’을 설치하라고 조령을 내렸다. 개원 29년(741년)에 이르러 ‘숭현학’은 정식으로 ‘숭현관(崇玄館)’으로 개칭됐다. 개원 29년(서기 741년)에는 노자의 화상(畫像)을 제작해 천하에 반포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개원 21년(서기 733년), 현종은 친히 《도덕경》에 주석을 달고, 《도덕경》을 도경(道經)의 으뜸으로 규정했으며, 《도덕경》을 과거시험 범위에 포함시켰다. 개원 25년(서기 737년)에는 도거(道舉) 제도를 규정했다. 개원 29년(서기 741년)에는 양경과 모든 주에 숭도학(崇道學)을 설립하고, 《도덕경》과 《장자》, 《열자》, 《문자》 등으로 과거시험을 보아 선비를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성당 시기의 이 일련의 조치는 중생이 수련문화를 이해하는 데 깊고 두터운 기초를 다졌다.
(계속)
원문발표: 2025년 9월 25일
문장분류: 천인(天人)사이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9/25/499705.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9/25/4997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