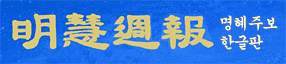글/ 간루(甘露)
[밍후이왕] 고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생활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태양신 아폴로의 불씨를 훔쳐 인류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캅카스산맥의 낭떠러지에 묶어 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며 독수리가 부리로 간을 쪼아 먹는 고통을 매일 겪게 했으며, 그다음 날 간이 다시 자라나면 또다시 쪼아 먹는 고통을 겪게 하였다. 수천 년 후 헤라클레스는 독수리를 죽이고 프로메테우스를 구원했다.
사마천은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는데, 그 죽음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것도 있고, 기러기 털보다 가벼운 것도 있다.”라고 말했다. 부친 생전에 다하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해 궁형을 받은 후에도 감옥에서 끝까지 ‘사기’를 완성하여 후세에 남겼다.
사실 ‘인(忍)’은 일종의 수양으로서 의미는 매우 광범하다. 일반 사람들은 ‘인’을 단지 참는 것으로만 여긴다. 이는 단지 한 방면으로써 ‘인’에는 인내, 고난, 손해, 인식, 받아들임, 견딤, 책임, 성취, 귀하되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전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현명하면서 겸손하고, 강직하면서 인내할 줄 알고 ‘인’ 중에 버림이 있고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롭고 타인을 배려하는 등등 여러 가지의 함의를 모두 가지고 있다.
세간에서 “’인(忍)’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刀)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좁은 뜻에서 마음에 칼을 하나 꽂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칼 아래에 있는 마음처럼 모순을 없애고 즉 인내함으로 모순을 없애는 것이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위험에 직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때 즉시 결단하여 적의 사기가 날카로울 때는 피하고 지혜로 모순을 없애 정면충돌을 피하여 불필요한 소모와 손실을 줄여 타인을 위하고 선한 마음으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인’이란, 마음속에 담아두고 울화가 치미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울화가 가슴에 차면 기가 통하지 않고 우울함이 쌓여 하나로 엉켜 간과 신장이 상하고 간이 상하면 쉽게 분노하고 신장이 상하면 지력이 낮아진다. 지력이 낮아지면 실언하고 말이나 행동거지에 예의가 없다. 그리하여 ‘인’이란 마땅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풀어내는 것으로, 그래야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하지욕(胯下之辱)
북송 소식(蘇軾)은 말했다. “필부가 치욕을 당하면 칼을 뽑아 들고 몸을 던져 싸운다. (匹夫見辱, 拔劍而起, 挺身而鬥)” 이는 진정한 용감함이 아니다.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은 갑작스런 침해와 마주해서 상대방과 쟁투하지 않고 인내하며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 모순을 풀어내어 상대방에게 내려올 계단을 마련해 준다. 이유 없는 모욕에도 담담하고 태연하게 대할 수 있다.
한신(韓信)의 탁월한 군사 전략과 용병술은 후세 병법가들에게도 경모와 추앙을 받고 있다. (新唐人 ‘笑談風雲’ 제공)
서한의 개국 공신 한신(韓信)의 ‘대인지심(大忍之心)’은 매우 감탄할 만하다. 한신은 소년 시절 보검을 차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한신이 장터에 걷고 있었을 때 한 젊은이가 대중 앞에서 그를 모욕하며 말했다. “네 놈이 덩치는 큼직하게 생겨 밤낮 허리에 칼은 차고 다니지만 사실 네 놈은 겁쟁이일 뿐이야.” “만약 네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칼로 나를 한 번 찔러 보아라. 그러나 죽기 두렵다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
한신은 젊은 사람을 한참 빤히 쳐다본 후에 납작 엎드려 그의 다리 사이로 기어갔다. 모여 있던 구경꾼들은 모두 한신은 겁쟁이라고 비웃었다.
훗날 한신이 유방의 대장군이 되어 옛날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젊은이를 불러 군중에게 말했다. “이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저에게 모욕을 주었을 때 저는 이 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를 죽이는 것은 명목이 없었기에 참아내 오늘날의 대업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용서를 비니 한신은 그의 죄를 사면하고 작은 벼슬까지 주었다.
인내하고 양보하는 것은 약하기에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인내하고 양보하는 것은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하고 서로 간에 화목을 위하는 인내하는 자의 드넓은 흉금을 드러내는 것이다.
와신상담(臥薪嘗膽)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하다. 말 그대로, 장작 위에 누워 쓰디쓴 쓸개를 맛보았다는 것인데,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이렇게 했다. 월(越)왕 구천(勾踐)이 패배한 후에 수십 년 동안 매일 식사 전에 쓸개를 맛보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서의 ‘인’은 하나의 견지와 하나의 책임감이다.
BC 498년, 오(吳)왕 합려(闔閭)는 파병하여 월(越)나라를 공격했다가 월나라에 패하였고 합려 또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2년 후 합려의 아들 부차(夫差)는 병력을 이끌고 월나라를 공격해 패배시키고 월왕 구천은 오나라로 압송되어 오왕의 노복이 되었다.
어느날, 오왕이 병이 들자 구천이 자발적으로 오왕의 똥을 맛보더니 만면에 회색이 감돌면서 오왕 부차를 축하하며 말했다. “똥의 색깔과 맛으로 판단할 때 전하의 몸은 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치료하셔도 좋습니다.”
3년 후 오왕 부차는 월왕 구천을 월나라로 돌려보냈다. 월나라로 돌아온 후에 구천은 여전히 오나라에서처럼 생활하면서 더욱 근검하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관원들을 위안하며 병졸을 훈련했다.
구천은 자신의 침소에 쓴 쓸개를 매달아 놓고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자주 쓸개를 바라보았다. 식사하기 전에도 먼저 쓸개를 맛보았다.
월왕 구천이 22년 동안 계획한 후에 오나라를 평정한 후 패주(霸主)가 되었다. 구천은 또한 오나라가 점령한 땅을 초(楚)나라, 송(宋)나라, 노(魯)나라에 돌려주었다.
고금동서, 대업을 이룬 사람은 모두 일반 사람 같지 않은 의지력과 반석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소무목양(蘇武牧羊)
BC 100년 전 흉노족이 한(漢)나라에 호의를 보여 이전의 교우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 한 무제는 즉시 소무(蘇武)를 파견해 100여 명을 인솔하고 흉노로 사신을 보내 선우(單于, 흉노족의 군장)를 답례하게 하였다.
소무 일행이 한나라로 돌아가려 할 때 흉노의 내란이 있었다. 소무 일행이 흉노에 구금된 후, 흉노에 귀순할 것을 요구당했다. 선우는 먼저 위율(衛律)을 파견해 금전과 관직으로 소무를 설득했지만, 소무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선우는 명령을 내려 소무를 물도 식량도 끊긴 노천 땅굴에 가두었다. 소무는 땅굴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변절하지 않고 목이 마르면 눈을 먹어 갈증을 풀고 배고프면 몸에 입은 양가죽 옷을 먹었다. 선우는 소무의 의지가 강한 것을 보고 소무의 절개에 탄복하여 차마 그를 죽이지 못했으며, 또한 그를 한나라로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다.

주위 나뭇가지에서 어린잎이 새로 돋아났지만, 한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기약 없이 막연했다. 소무는 면할 수 없는 슬픈 감정을 느껴 눈물을 흘렸다. 소무는 손을 들어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니 양 한 마리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소무에게 매매 짖었는데 마치 그를 위로하는 듯했다.
그래서 선우는 소무에게 북해 일대에 가서 양을 방목하게 하였는데 양이 새끼를 낳아야 한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소무는 유배지에 도착한 후에야 양이 모두 숫양인 것을 알았다. 그는 매일 한나라 조정의 부절(符節)을 걸고 양을 방목했다.
19년 후, 한나라 사신이 소무의 동료를 통해서 그의 상황을 알아채고 그를 북해에서 장안(長安)으로 모셔왔다.
소무가 출발했을 때 한창 장년이었는데 돌아왔을 때 이미 머리가 온통 백발이 되었다. 소무는 흉노로 사신으로 갔을 때 시를 지어 아내에게 이별 인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말했다. “떠나는 곳이 전쟁터이니 만날 날 기약이 없어라. 살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죽으면 오랫동안 그리워할 것이네(行役在戰場,相見未有期。生當復來歸,死當長相思)”
고대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임금을 배신한 사람을 ‘역모’한다고 인식했고, 죽기를 두려워해 절개와 의리를 포기한 사람을 ‘반역’한다고 생각했다. 소무의 ‘인’은 한나라에 대한 충심이었다. 정의와 절개을 지켜 고생을 인내하고 금전과 관직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며 흑발이 백발이 되어도 변절하지 않았다.
원문발표: 2020년 12월 19일
문장분류: 문화채널
원문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20/12/19/416722.html